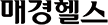ESG·순환경제·건강한 소비가 교차하는 'K-로컬 허브'로 부상
![세터하우스 광장마켓점. [사진=세터하우스]](https://cdn.mkhealth.co.kr/news/photo/202510/75664_84334_3054.jpg)
120년 역사의 전통시장 광장시장이 '빈대떡·마약김밥'으로 대표되는 K-푸드 성지를 넘어, 글로벌 패션·문화 복합 공간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최근 로우로우, 플리츠마마, 노스페이스, 코닥어패럴에 이어 마뗑킴,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세터 등 MZ 선호 브랜드까지 잇따라 점포를 열며 'K-패션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양상이다.
올해 들어 입점 러시는 더 빨라졌다. 7월 코닥어패럴 '코닥 광장마켓'이 문을 열었고, 10월에는 마뗑킴·세터·마리떼 프랑소와 저버·프룻오브더룸·키르시 등 5개 브랜드가 동시에 오픈했다. 시장 서문 인근 200평 규모 공간을 중심으로 브랜드가 모여들며 집객 효과를 노리고 있다.
선발 주자들은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로우로우는 일찍이 광장시장 1층 239호에 택스 리펀드가 가능한 점포를 열어 외국인 수요를 선제적으로 흡수했다. 플리츠마마는 2023년 이웃 광장점을 통해 전통시장 분위기와 지속가능 콘셉트를 접목했다. 노스페이스는 2020년 A-컬렉션(미세 하자 상품 리유스) 매장으로 자원 선순환 이미지를 구축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관광 수요'와 '진정성 마케팅'이 겹쳐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2024년 외국인 방한객은 1637만명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세에 근접했고, 2025년 상반기 누계도 증가세다.
서울의 대표 야시장·전통시장으로 꼽히는 광장시장은 해외 관광객과 MZ세대가 '로컬 분위기'와 '먹거리 경험'을 동시에 찾는 대표 코스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광장시장은 면직물·한복·구제(빈티지) 상권이라는 원형 위에 먹거리 골목과 포토 스팟, 팝업 스토어가 들어서며 ‘체류형 콘텐츠’로 확장 중이다.
최근에는 단순한 관광·쇼핑 공간을 넘어 '건강한 로컬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오래된 한복집의 손바느질과 수선 상점, 빈티지 리유스 매장, 친환경 브랜드들이 공존하면서 '오래된 것의 가치'와 '지속 가능한 소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시장을 찾는 MZ세대와 외국인 관광객들은 전통시장 특유의 활기 속에서 걷기, 수선, 체험 등 심리적 안정과 휴식을 동시에 느낀다. 광장시장은 이처럼 '도심 속 웰니스 리테일(Wellness Retail)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새로운 실험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브랜드 입장에선 '스토어=콘텐츠 스튜디오'로 쓰기 좋은 입지다. 세터하우스는 매장 내부를 한지·간살 등 전통 건축 디테일로 꾸미고 포토존·다국어 안내를 도입해 글로벌 방문객을 겨냥했다. 마뗑킴은 시장 상인 유니폼 협업·테이블웨어 굿즈 등 'K-푸드 결합형' 체험을 곁들였다.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영상과 릴스에 즉시 호환되는 장면을 만들고, 자연발생적 바이럴을 노리는 전형적 ‘리테일테인먼트’ 모델이다.
![바버 타탄체크 캠페인. [사진=LF]](https://cdn.mkhealth.co.kr/news/photo/202510/75664_84335_3141.jpg)
'헤리티지'의 재맥락화도 주목할 만하다. LF가 전개하는 바버(Barbour)는 최근 아시아 각 로컬 문화와 타탄 헤리티지를 엮은 글로벌 캠페인을 공개했다. 한국에선 셰프 오스틴 강이 한식을 매개로 전통 패턴의 동시대적 의미를 풀어냈다.
광장시장에서도 촬영을 진행, 브랜드가 로컬 먹거리·장소성을 스토리텔링의 '증폭기'로 삼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가격·임대 측면에서도 '핫 플레이스' 대비 효율을 기대하는 계산이 깔렸다. 성수·홍대 등 핵심 상권의 임대료와 집객 경쟁이 심화하는 사이, 광장시장은 전통시장 특유의 낮은 피트아웃 비용과 꾸준한 유동(관광객+로컬)을 동시에 흡수한다. 여기에 시장 2층 빈티지 상권과의 크로스 쇼핑 동선까지 더해져 객단가·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ESG·순환경제를 접목할 수 있는 무대라는 점도 매력이다. 노스페이스 'A-컬렉션'처럼 재고·리퍼브·아카이브 제품을 전면에 내세워 '합리적 가격+환경 가치'를 동시에 설득할 수도 있다. 광장시장 특유의 오래된 것과 수선·수리 문화가 브랜드 메시지와 자연스럽게 겹치기에 가능한 환경이다.
![마뗑킴 광장시장점. [사진=하고하우스]](https://cdn.mkhealth.co.kr/news/photo/202510/75664_84336_3221.jpg)
물론 과제도 있다. 광장시장은 외국인 고객 급증과 함께 과도 청구 논란 등 서비스 품질 이슈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로컬 상인·지자체가 질서 개선과 상생 프레임을 정교하게 구성하지 못하면, 일시적 유행으로 소진될 위험이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광장시장의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오프라인 리테일의 재발명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며 "전통, 먹거리, 빈티지, 관광이 한 공간에서 맞물리며 K-패션이 실험성과 헤리티지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무대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관광 회복세와 SNS 확산력,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비, 스토리텔링 친화적 공간이라는 조건이 겹치면서 브랜드 입점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 뒤 "특히 오래된 공간이 지닌 로컬의 건강한 에너지와 손의 노동이 주는 심리적 회복감이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장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가격과 서비스의 표준화, 외국인 안내 체계, 지역 상인 및 작가와의 협업 같은 로컬 웰니스형 상생 모델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경헬스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억울한 혹은 따뜻한 사연을 24시간 기다립니다.
이메일 jebo@mkhealth.co.kr 대표전화 02-2000-5802 홈페이지 기사제보
관련기사
- [PICK & FIT] "메리노 울로 따뜻하게"...노스페이스, 건강한 겨울 아웃도어 활동 제안 등
- [PICK & FIT] "지속가능이 곧 건강"…강태선 BYN블랙야크그룹 회장, UN피스코 수상 등
- [PICK & FIT] 프로-스펙스, 가을 러닝 건강 지킴이 '러닝 우븐 자켓' 출시 등
- [PICK & FIT] 삼성물산 패션, 브랜드데이 통합 프로모션 실시 등
- [르포] "한국적인 미식의 즐거움"…광장시장에 문 연 '제주위트 시장-바'
- 코로나19가 바꾼 차례상…이번 설도 '간편식'으로 해결한다
- [매일건강PICK] "840만 명 분석 결과… 백신, 암 위험 높였다?"
- 영원무역, WCD 비저너리 어워즈서 한국 기업 최초 수상
- "AI로 복지혁신, 국립대병원 강화"… 정은경 장관, 의료개혁 비전 제시
- "이번주부터 초겨울 날씨"…의류·침구 판매 호조 기대에 유통家 들썩
- 식품업계, 오프라인 마케팅으로 소비자 접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