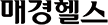요즘 의사를 더 많이 뽑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연일 나오고 있다.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분명 타당하다. 하지만 "의사 수만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것은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를 겪으며 더 다양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병원은 감당할 수 없는 환자와 검사 수요로 마비될 뻔했다. 그때 자가 신속항원검사 키트와 원격진료가 큰 역할을 했다. 영국과 미국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 자가검사의 정확도는 전문가가 시행하는 검사에 크게 뒤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술과 분업을 결합하면 기존 의료 체계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확인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이 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는 덴쳐리스트가 국가 자격을 취득해 직접 틀니를 제작·조정하고 공공보험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고령층의 비용과 대기 시간을 줄이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치과 기공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치과기공사는 법적으로 진료 보조에 머물러 있다. 노인 틀니 치료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만, 치과기공사는 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결국 치과에 납품하는 기공료 형태로만 보상을 받으며, 전문성에 비해 낮은 단가를 받을 뿐이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기공사 인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3년 1545명이던 국가시험 응시자는 2024년에는 91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방권 대학의 치과기공학과 경쟁률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치과 시장에서 투명교정장치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해외 브랜드 제품은 한 케이스당 기공 비용이 300만원에 이르지만, 국내 기공소에서 제작하는 장치는 약 100만원으로 훨씬 저렴하다. 다만 의료기기로 판매하는 경우 시설 인허가와 마케팅 비용이 더해지면서 단가가 올라가고, 이 비용은 결국 환자가 부담한다. 이 현상은 투명교정장치뿐 아니라 다른 보철물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현재는 치과 기공물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비용으로 공급되고 있지만, 인력 감소와 단가 압박으로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결국 국민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한 가지 더 우려되는 점이 있다. 국내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 숙련된 치과기공사들이 해외로 이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고령화로 보철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 기공사들의 취업을 늘리고 있고, 호주와 캐나다도 치과기공사를 기술 이민 직종으로 지정해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숙련 인력이 빠져나가면, 국내에서는 전문 기술을 이어갈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치과기공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은 법적으로는 진료 보조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의 치료와 안전을 책임지는 협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 개선이 늦어져 그들이 떠난다면, 나중에 그 공백을 메우기 쉽지 않으며, 그 결과는 결국 환자와 국민의 불편으로 돌아올 것이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부품 품질과 안전을 위해 최저 단가제를 운영한다. 치과 보철물도 다르지 않다. 지나치게 낮은 단가 경쟁은 품질 저하나 안전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치과 의뢰로 제작하는 기공물에는 최소한의 기준 단가를 보장하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사 업권을 보호하고, 산업을 지키며, 안정적인 의료시스템 운영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한 가지 해법만으로 의료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의사 수를 늘리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다면 의료 체계의 복잡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셈이다.
디지털 헬스, 자가검사, 원격진료 같은 기술 기반 솔루션과 더불어, 덴쳐리스트 제도와 같은 새로운 의료 시스템의 도입, 의료기사 업무의 안정적인 지원과 보장, 그리고 틀니나 지르코니아 보철물 등 의료보험 지원 급여가 의료기사인 치과기공사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치과 기공물 공적수가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직역별 권한 강화까지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속 가능한 의료의 해법이다.
매경헬스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억울한 혹은 따뜻한 사연을 24시간 기다립니다.
이메일 jebo@mkhealth.co.kr 대표전화 02-2000-5802 홈페이지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