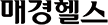5명 중 1명 노인인 우리의 미래 '에이지테크'에 달렸다
65세 이상 2024년 12월 23일 전체 인구의 20% 돌파
국가부채 세계1위, 의료비 급증한 일본 따라 갈 것인가
매경헬스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 벌어질 미래상을 소개하는 '에이지테크'를 시리즈로 게재한다. 또한 독자 여러분, 기업 및 의료기관과 함께 '초고령 파고'를 뛰어넘을 해법을 찾고자 한다. <편집자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며 '고령지진(age-quake)''고령쓰나미(age-tsunami)'가 밀려오고 있다.
2024년 12월 23일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23일 기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 5122만 1286명의 20%를 돌파했다.
2025년은 이제 우리가 한번도 가보지 못한 초고령사회가 본격 펼쳐지게 된다. '저출산, 초고령화'로 기형적인 인구구조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엄청난 패러다임 변화가 전개될 것이다. 특히 만 60세 이상 고령층 자산규모가 4307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고령층이 '지갑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30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계에서 '초고령사회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모범국가가 될 수도 있다. 고령층 자산규모 4000조 돌파는 매일경제가 금융감독원·통게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구추계를 바탕으로 연령별 순자산 규모를 분석한 결과이다.
노인은 사전적 의미로 '나이가 들어서 늙은 사람'이지만 의학적으로 '생체기능이 떨어져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노화의 중심에 선 사람'이다. 65세인 당사자에게 '노인'이라고 하면 손사래를 치겠지만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상 엄연히 보호받아야할 노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요즘 생체(건강) 나이는 의학 발달과 넉넉한 영양섭취로 달력 나이에 0.8을 곱해야 한다는 주장에 별로 거부감이 없다.
한국은 2002년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은 고령화사회에 이어, 2017년 8월에는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 독일은 40년, 일본은 24년 걸렸지만 한국은 15년만에 최단기간에 진입했다. 세계 신기록이다. 초고령사회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7년만이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https://cdn.mkhealth.co.kr/news/photo/202412/70951_77646_5825.jpg)
인구고령화는 정치·경제·사회 등 기존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꾼다. age-quake가 모든 영역에 엄청난 tsunami를 몰고 온다는 얘기다. 이는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전철을 밟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서 엿볼 수 있다.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에서 1994년 고령사회, 2005년 초고령사회 진입했으며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29.3%에 달한다.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후기고령자(75세 이상)는 2025년 전체 인구의 1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추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일본이 가장 높고, 이탈리아(24.6%), 독일(23.2%)이 그 뒤를 잇고 있다.
1990년대 일본에 찾아온 잃어버린 30년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가파른 인구고령화에 있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낀 고령인구가 소비를 줄이고 집안에 현금을 쌓아두면서 경기침체가 시작됐다.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고령인구가 늘면서 의료비는 폭증하고 정부재정 지출도 급증해 일본은 국가부채는 GDP대비 260%에 달해 세계 1위에 올라 있다. 일본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1994~95년 국가부채가 GDP의 60%대에 불과했지만 1998~99년 100%를 넘어섰다. 이어 일본은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급증하는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2012~13년 GDP의 200%를 돌파했다. 고령화 물결에 한번 풀린 브레이크는 제어할 동력을 잃었다. 일본은 2023년의 경우 예산이 114조 3812억엔이었는데, 의료비가 포함된 사회보장비가 36조 8889억엔에 달한다. 이 때문에 세입은 늘어난 게 없는데 세출이 계속 확대되어 35조 6230억엔(전체 예산의 31.1%)이 부족해 신규 국채 발행을 통해 메꾸기로 했다. 초고령사회로 인해 정부 예산의 31%를 빚에 의존한다는 뜻이다.
![일본 닛산 제조 공장 [출처 = 닛산 오파마 공장]](https://cdn.mkhealth.co.kr/news/photo/202412/70951_77649_714.jpg)
정치는 고령화로 갈수록 보수색채를 띠었고 고령인구에 반하는 정책을 내놓을 수 없어 국가부채는 갈수록 증가했고, 경제와 산업은 과거의 화려했던 제조업 마인드에 갇혀 급변하는 IT나 정보화물결에 제때 합류하지 못했다. 또한 사회는 활력을 잃고 점차 퇴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은 최근 고령화터널을 벗어나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일본의 고령화를 헬스케어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파괴적 혁신'을 읽궈내며 의료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쓰고 있다. 공적 영역에서는 급증하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 영역에서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의료비절감 정책' 및 '노인용 편익(silver care) 제품'들이 쏟아졌다.
대표적인 사례로 △건강관리 주체가 국가중심에서 지역책임제로 전환(지역포괄시스템) △환자치료 요양·재활중심으로 전환 △급성기병원 줄고 재활·요양병원 증가 △의사·간호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홈케어(왕진) 활성화 △의사 지역별 편중 해소위해 건보료 활용해 지방근무 의사에 지원금 지급(2024년)△간호사의 일부 의료행위 인정(2020년) △장롱 의사면허 연수 후 복직 지원 △의사부족 지역, 과잉지역에 의사파견 요청 쉽게 개선 △병원간 중증환자 원격으로 진료지원 △컴퓨터·스마트폰 활용한 온라인 진료 도입 및 보험적용 △처방의약품 자택에서 수령 가능(2020년) △거동불편한 환자의 방문마사지 수가적용 △집에서도 신약 임상시험 참가 및 데이터전송 허용 △6만개 조제약국의 공정한 가격경쟁 유도 △관리약제사 복수의 약국에서 겸직 가능토록 규제완화 △일반 의약품 판매점(드럭스토어) 디지털화로 개혁 △ 소니, 올림푸스, 히타치 등 전기·정밀기기회사들의 재생의료(바이오)분야 진출 적극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https://cdn.mkhealth.co.kr/news/photo/202412/70951_77647_365.jpg)
일본의 실버케어 용품은 △말하는 로봇인형 △근력보조로봇 △와이파이 센싱기술 △휴대 화장실 △접이식 샤워의자 △미끄럼 방지제 등 매우 다양하며 시장규모가 약 100조엔(약 8000억달러)으로 추산된다. 한국무역협회가 분석한 한국 실버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72조원에서 2030년 168조원으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병문 의료전문기자
매경헬스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억울한 혹은 따뜻한 사연을 24시간 기다립니다.
이메일 jebo@mkhealth.co.kr 대표전화 02-2000-5802 홈페이지 기사제보
관련기사
- 초고령사회 1년차 대한민국, 주목할 키워드 '시니어 하우징'
- 에이지테크⑦ '슬로우 에이징' 키워드와 함께 성장한 뷰티 디바이스
- 에이지테크⑧ 아동용보다 잘 팔리는 성인용 기저귀…'스마트' 기술도 각광
- 에이지테크 기업① 유한킴벌리, 국내 최초 시니어 위생 용품으로 도약…1000억 브랜드 꿈꿔
- 에이지테크⑩ 늙어가는 韓…분유 대신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주목한 유업계
- 에이지테크⑪ '3조원' 케어푸드 시장 선점 나선 식품업계
- 에이지테크 기업②"전문성이 힘"…케어푸드 리딩하는 '현대그린푸드'
- 日 도쿄종양내과, 하이브리드 면역세포 암치료 결과 발표
- [에이지테크] ① "기술 없이 제도도 없다"…일본 개호보험의 새로운 실험
- [에이지테크] 韓 초고령사회 진입… 매경헬스, '에이지테크'의 미래 조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