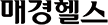ESG 시대, 근로자 건강관리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
국내외 기업 비교로 본 '건강 지표' 공백과 개선 과제
![ESG 경영이 확산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핵심 전략으로 다루진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기준에 맞춘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건강관리 지표 도입이 시급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cdn.mkhealth.co.kr/news/photo/202510/75934_84977_214.jpg)
대한민국의 고도성장 이면에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철야 근무로 인한 과중한 업무, 빈번한 산업재해,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둥이 여전히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매년 수백 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우울증·불안장애·자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근로 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근로자 건강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인 시대'다. 매경헬스는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해외 우수 사례들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근로자 건강관리와 복지 실태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기업들의 화두로 자리잡았지만, 정작 '사회(S)' 영역에서 근로자의 건강·안전은 전략적 우선순위로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 환경(E)·지배구조(G)에 집중하는 사이 '일터 건강'이라는 핵심 연결고리는 간과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최근 공급망과 근로자 건강·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흐름이지만, 국내 기업들의 실제 보고 항목은 아직 제한적이다.
건강·안전 빠진 ESG는 불완전하다
기업이 ESG를 외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 산업재해 예방, 피로·정신건강관리 등은 여전히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기업의 리스크 관리, 인적자본 확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2300만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직업성 질병 및 사고로 인해 GDP의 1.8∼6.0% 규모의 인적자본 손실이 발생한다.
근로자가 건강하지 않으면 결근·부상·사고 리스크가 커지고, 이는 기업 비용 상승뿐 아니라 공급망 전체 작동에 영향을 준다.
그럼에도 국내외 기업들의 ESG 보고서에서는 건강·안전 관련 정량적 지표나 선제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덜 드러나고 있다. 이는 환경 분야처럼 통일된 측정기준이 없고, 공급망 전체로 확장하기 어렵다는 현실 때문이다.
또 ESG 평가기관이 건강·안전 항목을 핵심 KPI로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기업 내부에서도 투자 우선순위로 반영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국내 사례, 제한적 공개 vs 선언적 목표

현대자동차는 2024년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Employees' 항목을 별도 설정하며 작업자 안전문화 강화에 나섰다. 또 공급망에서 'Health and Safety' 리스크를 다루기 위한 조달정책도 발표했다.
그러나 보고서 내에는 재해율·사고건수 외에 근로자의 만성질환 예방, 피로관리·정신건강, 협력업체 근로자 건강관리 등 건강관리 세부 지표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삼성전자는 2025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 'zero major industrial accidents and a top-tier global lost time injury rate (LTIR) by 2030'을 목표로 Safe & Healthy workplace 조성을 명시했다.
또 회사 홈페이지 내 'Workplace Safety Management' 섹션에서는 사업장 내 잠재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완화하는 리스크 평가 절차를 운영 중임을 밝혔다.
공급망(협력사) 대상으로도 'Environmental and Safety training / consulting' 프로그램이 있으며, DX·DS 부문에서 수백 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교육 및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공개했다. Supplier LTIR 및 공급망 교육·감사 실적까지 수치로 공개하는 등 범위를 넓히고 있다.
LG전자는 2023~2024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 'Employee Health Improvement and Prevention Management' 항목을 통해 정기건강검진, 심리상담센터 운영,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웨어러블수트 개발 등의 활동을 설명했다.
보고서 내 'Occupational Health & Safety' 항목에서는 노동자 훈련, 사고예방을 위한 리스크 평가, 사업장 및 공급망 대상 안전·건강 교육 등을 명시했다.
또 그룹 지주회사인 LG 그룹 차원 보고서에서도 LTIFR(Lost Time Injury Frequency Rate) 수치를 공개, ‘안전·건강관리는 경영우선순위’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근로자 정신건강, 피로관리, 하청업체 근로자 건강지표 등까지 정량적 공개가 매우 상세하진 않은 편이다.
이처럼 국내 기업은 '안전'이라는 전통적 항목에는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지만, 건강(Health)과 웰니스(Well-being)를 포괄한 '일터에서의 건강' 관점은 아직 보고체계 속에 깊이 들어가 있다는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해외 기업 사례, 건강·안전 KPI로 제시하다
네덜란드 소재 생명공학·식품원료 기업 Corbion은 2024년 연차보고서 내 'Health and Safety' 섹션에서, 자사 및 계약자(근로자+협력사) 전체 대상의 기록가능사고율(Total Recordable Injury Rate, TRIR)을 공개했다.

2024년 수치로 3.58건/백만 노동시간(2023년 2.55건에서 상승)이라는 수치를 명시한 것. 또 모든 제조소 12개 중 10개소가 ISO 45001 인증을 완료했으며, 계약자를 포함한 보고체계 구축, 근로자 참여형 행동기반 안전(Behavior-Based Safety) 프로그램 도입 등을 상세히 언급했다.
또 사고율(Lagging Indicator) 수치 공개뿐 아니라, 근로자 참여, 안전문화 개선, 계약자 포함 범위 확대 등 건강·안전을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선언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계 에너지 기업 BP는 지속가능성보고서 및 웰빙 보고서(Health & Well-being Report)에서 직원 및 계약자 대상 건강 및 복지 프로그램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직원의 온라인 의료·웰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있다. 다만, 사고율이나 부상지표처럼 숫자로 구체화한 근로자 건강지표는 보고서 전면에 등장하진 않는다.
전통적인 '안전사고' 중심보다는 근로자의 전반적 건강·복지(Well-Being) 프로그램을 ESG 전략으로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글로벌 소재·화학 기업 PPG는 2024년 Sustainability Report 내 'Employee Safety & Health' 섹션에서 ‘환경·보건·안전 성숙도 모델(EHS maturity model)’을 도입해 위험우선 사업장 선정, 예방지표(Leading Indicators) 비중 확대 등을 언급했다.
보고서에는 '안전사고 발생률 등 후행지표에 더해 사고예방을 위한 리딩지표(Leading Indicators)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했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단순 부상률 공개를 넘어서 사전예방형 지표체계(leading indicator)에 초점을 맞춘 실무적 접근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영국계 소비재기업 Unilever는 'Safety at work' 페이지에서 2023 회계연도(10 월 1일~9 월 30일 기준) TRFR(Total Recordable Frequency Rate: 백만시간당 기록가능사고건수)을 0.58건으로 보고했다. 이는 전년 대비 13% 개선된 수치다.
이처럼 사고건수 중심이지만 정량적 개선성과를 보고한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또 그들은 공급망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리스크 평가·감사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도 한계는 있다. 근로자의 피로·정신건강 등 건강관리 지표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계 식음료기업 Nestlé는 'Safety and health at work'란 자료에서 근로자 및 현장계약자를 포함한 작업장 안전·건강을 '존재하는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2022년 지표집을 보면, 전체 사업장에서의 재해·질병·근로자 건강관리 세부 지표 개선을 위한 행동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수치 공개는 안전사고 중심이며, 웰니스·피로도·정신건강 등 건강 전체망을 반영한 정량지표는 제한적인 편이다.
왜 ESG 보고서에서 '건강'이 빠지는가
![국내 기업들은 ESG를 강조하면서도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 관리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cdn.mkhealth.co.kr/news/photo/202510/75934_84978_2428.jpg)
ESG 보고서에서 근로자의 건강 항목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이유는 ▲수치화의 제약 ▲리포팅 프레임의 한계 ▲공급망 확장의 어려움 ▲평가기관 기준의 미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만성질환, 피로, 정신건강 등은 산업재해나 부상처럼 즉시 수치화하기 어렵다. 현재 대부분의 보고서는 사고 발생률·부상률 등 후행지표(lagging indicator)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교육 참여율이나 위험요인 개선 건수 같은 선행지표(leading indicator)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로 인해 리포팅 프레임 자체가 건강관리의 선제적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본사 직원뿐 아니라 협력사·하청 근로자까지 건강·안전 관리망을 확장하는 일도 쉽지 않다. 여기에 ESG 평가체계 내에서 '일터 건강'과 '안전' 지표의 비중이 환경(E) 영역만큼 높지 않아, 기업 내부의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ESG 보고서에서 건강 항목을 강화해야 한다. 건강과 안전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기업과 투자자, 평가기관 모두가 인식해야 할 핵심 리스크이자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재해·부상률 외에도 피로도, 정신건강 프로그램 참여율, 유해환경 노출 저감률 등 정성적·정량적 지표를 폭넓게 도입해야 한다. 사고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교육시간이나 위험요인 개선 건수 등 예방 중심의 선행지표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협력사와 하청업체까지 건강·안전 리스크 평가 및 실행 범위를 확대하고, 이사회·경영진 KPI에 건강·안전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보고서 내 별도 챕터로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ESG 경영이 보편화된 지금, 기업은 환경과 거버넌스보다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사회(S)' 영역,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건강을 포함한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다.
해외 주요 기업들이 이미 안전지표 공개를 넘어 웰니스(Wellness)와 정신건강까지 보고체계에 포함시키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야 한다. 근로자의 건강은 기업의 리스크이자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다. ESG 보고서에서 건강 지표를 강화하는 일은 ‘사회적 책임’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 돼야 한다.
근로자의 건강·안전…ESG의 마지막 과제
![근로자 건강·안전 ESG 공시를 강화하는 글로벌 흐름 속에서, 국내는 법적 기반과 투자자 참여가 미흡해 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DALL.E]](https://cdn.mkhealth.co.kr/news/photo/202510/75934_84980_2832.png)
국내 한 ESG 평가기관의 연구위원은 "건강과 안전은 글로벌 ESG 논의에서도 핵심 요소로 꼽힌다"며 "유럽은 이미 법제화가 진행 중이고, 미국도 인적자원 관리 차원의 공시를 강화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역시 관련 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의식해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연구위원은 "기업들이 근로자 건강과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고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들은 국제 기준에 맞춰 비교적 체계적인 ESG 공시를 수행하고 있으나, 중견·중소기업은 여전히 법적 최소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고 전한 뒤 "특히 정신건강이나 협력사 근로자 등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에 서한을 보내거나 대화를 통해 인적자원 관리 개선을 요구하는 등 시장 압력이 작동하지만, 국내는 아직 이런 투자자 참여 문화가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편이라는 것.
그는 "사회 영역 중에서도 노동과 안전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분야로 환경, 소비자, 공정거래 부문은 감독 체계가 비교적 명확한 반면, 노동 영역은 제도적 기반이 아직 미흡하다"면서 "산업별로 특유의 ESG 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각 산업협회나 민간 평가기관 등이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평가기관들도 향후 산업별 연구나 해외 사례 공유를 통해 기업 지원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경헬스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억울한 혹은 따뜻한 사연을 24시간 기다립니다.
이메일 jebo@mkhealth.co.kr 대표전화 02-2000-5802 홈페이지 기사제보